‘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정당한 편의제공’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국내법
최소기준 정도만 지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끝나
전문가들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 권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이용률은 100%다.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이 편의점을 쓴다는 뜻이다. 2006년 8,900여 개였던 편의점은 점점 늘어나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 수는 43,975개가 됐다. 이 중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830개, 약 1.8%뿐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대부분의 편의점에 갈 수 없다.
이유는 법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3조 별표1에는 이 법의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하인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전체 생활편의시설 중 98.8%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면적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7조 때문에 정해졌다. 7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 근거와 기준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린 것이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장애인등편의법 7조의 위헌여부를 가리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협소하게 규정해, 법이 오히려 대부분의 생활편의시설을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주최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뜻
매장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 건 소상공인 보호조치 때문이다.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쪽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협약에는 ‘과도한 부담’인지를 판단할 때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때 장애인의 불편이 바로 해소되는 ‘효과성’이 있다면 아무리 부담이 과도해도 무조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국내법은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효과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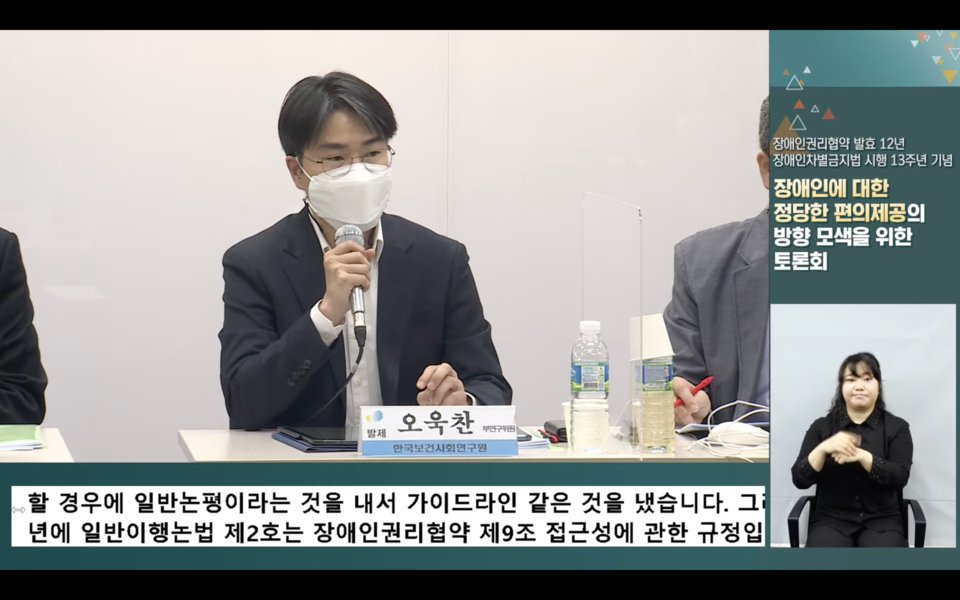
이 같은 설명을 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부담’인지를 판단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쪽이 공적자원이나 외부자원을 총동원해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EU의 경우 편의제공 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편의제공자가 비용이 부담돼 제공을 거부하고 싶다면 공적지원, 보조금 등의 자원을 충분히 알아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제공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상 정말로 불가능했다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편의제공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능한 한 모든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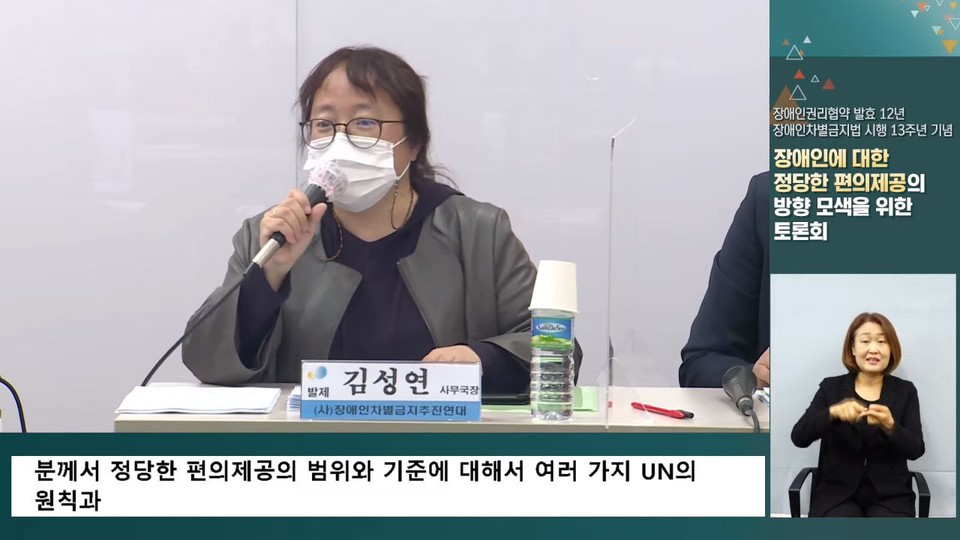
- ‘정당한’이라는 단어만 적고 장애인 부당하게 대하는 국내법
또한 외국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말을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부르고 있다. 국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이 ‘정당한’으로 바뀌어 명시됐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여러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가 의견을 낸 결과 ‘자기결정권’, ‘선택권’ 등의 단어도 들어가게 됐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국내법은 편의제공을 배려나 시혜가 아닌, 모두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권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떤 건지 세세하게 나열돼 있지 않은데 이건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미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끝난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어도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식이다. 심지어 준공검사 끝난 후 편의시설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검사가 끝나면 장애인용 주차장을 싹 없앤다거나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다른 매장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이 사례들을 적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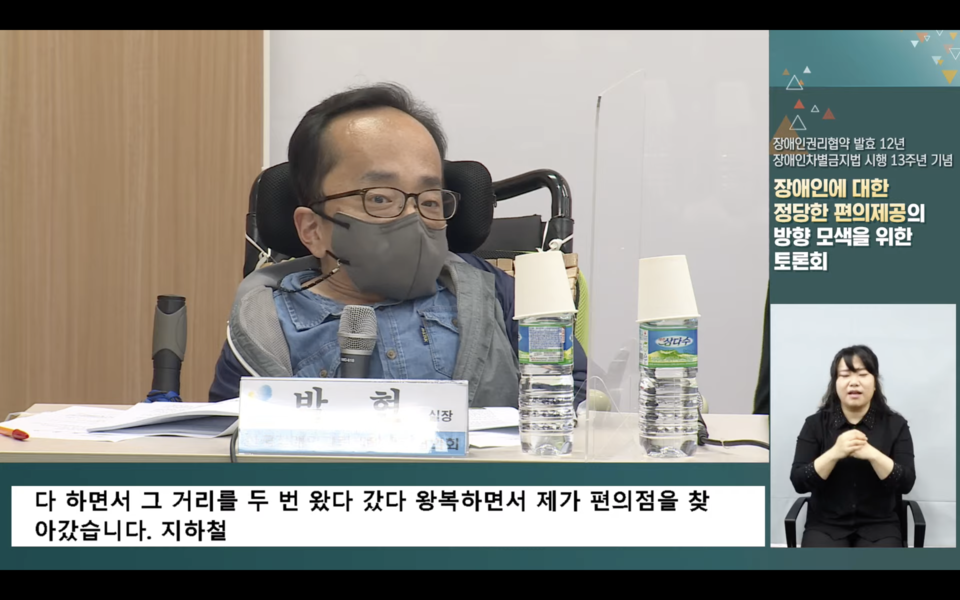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당한 편의제공 시 특정한 개별상황에 맞춰 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호텔에 장애인용 객실이 모두 꽉 찼을 경우, 장애인 고객에게 방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근처에 장애인용 객실이 남아있는 다른 호텔을 조사해 장애인에게 알려주고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최소기준 정도만 지키면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끝나는 국내법과 대조적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을 차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나는 저신장 장애인이다. 장애인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걸이가 높아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세면대가 높아 손을 못 씻거나 거울을 보지 못해서 옷매무새를 대충 매만지고 나온 적도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표준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 (http://beminor.com/)

